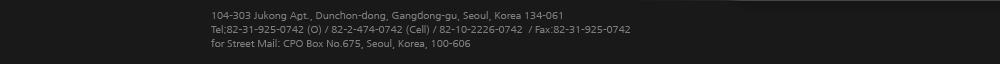Quo vadis? la Korea
Raymond Aron 은 국제정치라는 의미나 표현을 “국가간의 전쟁과 평화” 라는 실제적인 카테고리로 나타내면서 기존의 학문적 성격을 이용하여 설명하고자 하며, 따라서 그는 여기에 역사, 정치 사회학 (Sociologie politique ), 외교- 전략적 의미를 포함하여, 이것을 所與 ( Donne ) 와 傾向 ( Tendance ) 로 나누어 파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는 여기서 그 단위인 국가들의 다수가 그 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우월할 수 없는 자유롭고, 경쟁적인 체제-관계에서 그 규칙성을 나타내려는 시도를 통해 질서를 말하고자 한다.
실제로 국가들이 전쟁과 평화를 번갈아 겪어 가면서 그 안전과 번영을 도모하려는 노력들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그 지위를 유지해 왔다.
한반도는 19세기 말에 제국들의 압도적 힘이 지배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희생을 당해 그 명목을 잃었고, 20세기 중반에 국제적 권위의 보편적 질서가 확립된 시대에 들어 주권적 지위를 회복했고,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 그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경험과 교육 등은 그 국민들의 소망과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과 전망을 진작시키는 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다
오랜 굴욕적 지배의 수모를 겪은 후의 독립에 이어 1950년-1957년 기간에 한반도는 전쟁과 휴전이라는 혼란과 분열을 통해 민족적 자존심의 큰 상처를 입었다.
분열과 대립.
이렇게 짧은 역사 속에서 민족이 겪은 전쟁과 분단의 경험을 공유할 수 없는 지도자의 출현, 그에 따른 역사적 사명감에서 또 현실적 환경의 차이에서 오는 시대적 소명을 인식하는 권력의 등장은 그 권력의 나아갈 방향과 추구해야 할 가치의 의미를 현실화 하는 것이 누구의 책임으로 하여야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적해야 할 것은 국민 들의 자각과 선택에 대한 책임의식, 그리고 지역 지도자들의 한층 강한 책임의식은 물론, 폭 넓고 장기적인 안목의 구비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성숙단계에 있지 못하고 제도적인 모습은 갖추었다고는 하나 그런 의미에서 공고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지 못하며, 그 국민적 정치 문화는 주변적 위치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남북간의 분열과 대립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도출이 늦어지는 것도 이와 관련된 문제로 보인다.
분열된 상태에서 남-북한이 각각 지역 동맹과 이념을 근거로 한 대립적 체제에 속한 지금의 상황은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야 하는 최악의 어려움을 형성하고 있다.
1) 지도자의 특성: 외교 정책의 형성에의 영향
이 글의 작성을 위한 편의와 다른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와 관련된 학자들의 글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방법을 쓰고자 한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논의의 현실은 사실상 한반도 주변국 들의 지도자 들의 발언을 통해 제시되었거나 논의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대화의 결여에 이른 상태에서 한반도 문제의 궁경을 뚫꼬 나가는 문제는 남-북 내부관계, 그리고 주변국들의 태도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방향 이외에도 군부의 견해와 민간 학자들의 견해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A) 한국 지도자의 특성,
한국 정치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소통의 문제로 표현하면서 지도자와 참모들, 국민과 지도자들의 의견 소통,:등의 문제로 표현하고 있고, 여기서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언론을 통해 알 수 있는데, 특히 대외 관계와 관련하여, 외부 자료들은 Maverick 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제일 먼저 쓴 것은 Chung-Min, Lee, ( “South Korea’s New President is a political maverick with an eye on Ending the Status quo,” ,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March 15 2022) 이지만 2024년 2월 22일 the Korea Times 도 윤대통령을 steadfast, stubborn Political Maverick 이라고 표현했다. 주로 북한을 적대적으로 고립화 시키면서, 한-일관계의 동맹화를 주도적으로 추구하고, 그리고 Biden의 표현에 의하자면 특히 와싱톤 선언에서 보듯이 한-미-일 관계에서 한국 대통령의 주도적 입장이 이끌어 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Washington and Seoul are Preparing to Consult in a nuclear Crisis, Adam Mopunt, March 20, 2024,참조 )
일부 유럽쪽 자료 –스웨든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 ( V-DEM )들은 한국 지도자의 독재화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 Hardline Policy ), 그리고 한국 내부의 분열과 권위주의적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극단적인 입장으로 보고 있는 것도 있다.( The Diplomat Joen E. Cho, Dec. 1, 2022 on the Korean past )
이러한 종류의 글들은 David G. Winter 가 쓴 Leadership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Foreign Policy ( 2021, 03, 02 ) 에서 좋은 참조를 볼 수 있다.( Leadership Personality and Foreign Policy, March 24, 2021 Timothy Graville,등 참조 ) 예를 들어 Kendra Cherry 는 자기존중심의 상실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이용하여 자기 추구 가치를 주장하고 있고, 도움을 얻으려는데서 어려움을 당하고도 있으며,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려는 경향을 볼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윤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북한을 전체주의적 체제로 표현하고 반공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대화를 외면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의 보유와 그 사용을 언급하면서 부터 남-북한 관계는 다시 냉전화하는 관계로 들어 가면서 쌍방이 군사적 대립을 강조하는 상황으로 변하였다. ( The Shadow of Yoon’s Authoritanianism,; The Yoon’s regime’s policing. James Peak, June 2, 2023 )
한국 정부는 북한에게 대화의 장이 열려있고 대화로 나오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이러한 입장은 북한의 강경한 군사적 대응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고, 남-북한이 그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군사적으로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그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2)동북아와 세계 안보 위협의 중심지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는 2024년의 국제적 Conflicts to Watch 지역으로 Israel-Hamath 등이 포함된 중동 지역과 대만-중국 관계가 포함된 동북아 지역을 들고 있다. 그것이 미칠 영향을 포함한 위험 지역은 중국, 러시아, 미국 등이 관련된 동복아 지역이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Conflicts to Watch in 2024, Preventive Priorities Survey Results, Jan. 4, 2024 )
그러나 Jake Sullivan 미국 대통령 안보 보좌관이 발표한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에서 나온 보고서는 Ukraina 와 북한을 세게 안보를 위협하는 주요 지역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북한을 셰계적 불안정을 높이는 지역으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Sullivan 보좌관이 북한을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 보면서 중국에게 북한에 대한 개입적 자세를 언급했다고 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Remarks and Qs and As by the Security Adviser Jake Sullivan on the Future of US-China Reltion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Jan. 30 2024 )
사실살 이 글은 미국과 중국이 경쟁적이면서 동시에 이 경쟁이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두나라의 관계를 안정에 머물도록 이끌고 있음을 Sullivan 은 강조하고 있었고, 기술의 이전 등의 문제에서 양국은 상당히 불안정한 관계가 이루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적 경쟁적 불안정한 양국 관계에서 Sullivan 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의 위협에 대해 중국이 개입하기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미-중 관계를 고려할 때 과장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더군다나 양국은 one China policy를 둘러싼 갈등을 겪고 있으면서 교류와 소통을 통한 안정된 관계를 지향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한 논리로 보였고, 대만에서의 군사적 관계의 악화를 계속 추구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도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는 의문을 낳고 있닥.
미국이 자기 행동의 합리화를 위한 논리 주장이 현실적인 미-중 관계의 개선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한반도 전문가
.미국에서의 한반도 문제의 전문가들이 변화를 보이고 있다. 종전에는 대부분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군사, 정보 분야 출신이 주축을 이루었으나, 따라서 대부분이 이들 의견이 군사분야에 국한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Korean-american 들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글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 그 내용도 군사적인 것에서 외교-협상 분야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북한이 종전의 핵 무기 개발에 주력해 온것에서 최근에는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서의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경주한데서 영향을 받은 것으노 보인다.
이것은 또한 종전의 북한의 핵무기 철폐 등을 위주로 한 전략에서 철폐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어려워 지고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추구에 따른 변화를 추구하는 의미로 되면서 핵폐기를 위한 단계의 변화에서 군축 논의와 군비 통제 등의 중간 단계를 거치려는 의견이 대두 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인물이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 고위관리, 그리고 미라 랩 후퍼 백악관 국가 안보회의 대변인 등이 여기에 속하며, 특히 Asia Program 의 Yong-suk Lee 의 글은 주목해 볼 만 하다.( US, and North Korea: Testing the Water on Arms Control and Reduction, Dec. 21, 2023 ) * * Lee 는 최근에 발표된 북한의 GDP의 추정치가 World Bank 의 자료는 18 Billion 로 나와 있으나 한국의 자료에서는 이것이 1.8 Billion 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수석 대변인이 3월 5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완전 비핵화는 한-미의 공동 목표라고 하면서, 이 과정에서 중간 조치 ( Interim steps ) 라는 미국의 발언은 한국 정부에서도 담대한 구상의 취지와 같은 것이라고 언급하는 내용에서 북한이 핵 폐기 의지만 밝히면 이를 위한 단계적 조치들이 취해 질 것이라고 동조의 발언이 나왔다.
미국의 NSC도 후퍼 보좌관의 발언과 관련하여 미국이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서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위험을 줄이는 것을 포함해 가치있는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한반도 문제와 미국
1945-1957 기간에 미국은 한반도에 정책적 개입을 해왔고, 지금도 미국은 28,500 명의 미군을 주둔시키며 이 지역에서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한반도의 분단도 이와 같은 80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1970년대 부터 남-북한 간의 대화를 미-중공 관계 개선의 신호로 열어 왔으나 바이든에 이르기 까지 분단된 한반도의 변화를 위한 시도는 제대로 시도되지도 못했다.
이 지역에서 미국은 소련과 중국을 번갈아 상대해 가며, 안정을 내걸고 있으나 불꽃을 향해 쫒아가는 벌 나비처럼, 미국은 세계 도처의 분쟁지를 찾아다니며 군사적 개입과 무기 지원을 집요하게 추구해 왔다.
이들 분쟁 지역마다 개입에서 미국은 어느 것도 확실한 매듭을 짓지 못하고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군사적 개입을 한 상태로 있다. 한반도,베트남, 중동, 동유럽 등 격전지를 섭렵하면서 안정을 주장하고 있다.
John F. Kennedy 대통령의 서거 60년을 보내면서 그가 주장했던 미국을 위한 경고와 지적을 망각하고, 미국의 지식인들은 이러한 미국의 정책- 미국 제일주의를 외치는 지도자들의 행태에 애써서 대리 만족을 표하는 것 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최근에 벌어진 Ukraina 사태에 미국, 영국 등은 러시아의 침입에 대항한다는 명분으로 연합국들의 도움으로 그 안보를 지킨 한국에게 대러 전을 벌이고 있는 Ukraina 에 무기와 병력을 보내도록 종용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어있었던 북한이 그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러 시아에 접근한 것을 계기로 미국은 Ukraina 로 하여금 한국의 군사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신냉전적 정책적 딜렘마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타레를 더욱 꼬이게 하고 있을 뿐이다.
바이든은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인들의 도움을 받았으나 당선 후 한반도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을 위한 정책적 시도는 없었다.
중국을 봉쇄하는데 몰두하던 그가 실수를 저지른 것은 AUKUS 동맹의 결성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동맹국인 프랑스를 기만하는 조치로 미국의 우선주의를 강조한 것은 그의 대외정첵에서 도덕성을 몰각한 심각한 결과를 낳았고, 미국은 프랑스에게 사죄를 위한 지원과 수차례에 걸친 대통령의 답방를 치루어야 했다.
미국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정책은 선명성, 그 정책적 명분, 미래를 내다보는 전망 등에서 혼란과 지리멸렬된 사고 등으로, 그 국내문제를 제쳐 놓고라도, 난맥 상대에 있으며, 한반도 문제를 해결보다는 더욱 궁경으로 몰아가고 있고,미국 우선주이를 위해 인접국이나 동맹국들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공허한 개념이 아니다. 갈등을 해소한다는 의미에서 평화란 당사국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등에 합의와 의한 신뢰를 쌓아가는 관계가 중요하며, 외교-전략적 방법을 통한 균형점의 타결을 위한 폭넓은 견해와 유연한 사고가 겸비되어야 한다.
지도자는 자기의 정책을 위한 참모들과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만 볼 것이 아니라 지도자와 참모의 의사소통을 통해 안목이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관계의 조정, 그리고 새로운 형성을 통해 현명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독일의 통일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선적으로 동-서독 간의 신뢰 관계의 형성 위에 미-소 등 강대국들에 대한 설득이 그 효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 알라스카에서 있었던 미-중 고위급 회담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나타나던 동양국가들의 예양적 태도와 이에 대한 서양국가들의 강압적 태도는 더 이상 국제질서의 유지와 평화 유지를 위해 반복될 수 없다는 의미의 인식의 변화를 예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힘의 변화가 그 바탕으로 하여 국제질서에서의 주도적인 변화를 이끌려는 중국의 강한 의지의 일단을 나타낸 것으로 보여진다.